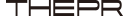[더피알=이슬기 기자] 지자체마다 거창한 슬로건을 우후죽순 만들지만 딱히 머리에 남는 건 없다. 얼핏 들어본 것 같지만 뭘 말하고 싶은지 감은 오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고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할까? 해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컨설팅그룹 인터브랜드(Interbrand)의 문지훈 대표를 만나 지자체 브랜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브랜딩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브랜딩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브랜딩은 기본적으로 활동의 목적 자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활동을 보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건지, 사업이나 투자를 유치하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목적은 모호한 채, 단순히 지역을 알리는 데만 급급한데, 그러다보니 메시지도 모호합니다. 이건 지자체 브랜딩에 대해 많은 지원을 했던 지난 정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저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를 만들었으나 행해지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나마 기억에 남는 케이스로는 이천쌀을 들 수 있겠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끔 하려는 명확한 목적, 이천쌀이라는 구체적인 제품을 알린다는 기조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브랜딩 기조는 있지만 정말 잘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으리라 짐작하지만 브랜딩 활동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브랜딩 측면에서 지자체들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목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없고 브랜드의 존재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이 서울(Hi Seoul)’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자 했을까요?
예를 들어 도쿄의 ‘미드타운(Midtown)’은 플레이스 브랜딩 면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미드타운에는 록본기 힐스를 비롯한 상업지구가 있고 공원과 박물관이 있어요. 도쿄 안에 다양한 요소를 갖춘 하나의 타운을 형성했죠 . 그곳의 아이덴티티가 ‘다이버시티 온 더 그린(Diversity on the green. 녹색 위의 다양성)’입니다. 서울보다 더 붐비는 도쿄에서 그게 나온 이유는 그 주변에 유난히 숲이 많아서예요. 일단 지역적 특색을 먼저 감안하고, 그 안에서 박물관이나 공원 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주고 상업지구에 비즈니스도 유치한 경우죠.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양성을 표방하는 것, 미드타운 자체가 숲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와서 즐기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그에 반해 하이 서울은 캐치한 프레이즈정도로는 들리지만 서울의 특성은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딩에는 지역의 명확한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지역이 그저 슬로건이나 문구에 그치다보니 브랜딩 전문가인 저조차도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네요.
지자체가 특색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 브랜딩은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오리지널리티죠. 지역의 역사 등을 고려해 독창적인 특성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환경, 이해관계자들의 니즈, 경제적 부가가치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예를 든 도쿄 미드타운의 경우 역사성과 환경을 통해, 숲이 많고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주변 이해관계자들도 워낙 많았을 것이고요. 그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해 다양성을 잡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각 지자체들은 오리지널리티, 환경, 이해관계자들의 니즈, 경제적 부가가치를 모두 검토해 녹여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잡아야 하죠. 지역의 경우 일반적 기업이나 제품보다 훨씬 더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오리지널리티·환경·이해관계자 니즈·경제적 부가가치 고려
‘하이서울’의 경우, 브랜드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시(市)의 공격적 홍보로 일정 수준 이상의 브랜딩에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치에 무게를 둔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하이서울’에 대한 인지도만을 고려한다면 그런 평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브랜드라는 건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브랜딩 활동을 합니다. 그게 과연 ‘갤럭시’라는 상품 하나를 알리려는 단순한 목적일까요? 그들은 휴머니즘, 관계를 강조하고 이것은 다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기업 브랜딩과 연결됩니다. 결국 삼성의 브랜딩 효과는 갤럭시를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갤럭시를 ‘그런 느낌’으로 인식하는 데 있는 거죠.
런던은 도시를 새롭게 브랜딩하면서 ‘런던 언리미티드(London unlimited . 무한한 런던)’을 썼습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끊임없는 발견(constant discovery)’입니다. 런던은 유럽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곳이지만 도시 자체의 유적들도 많아요. 뮤지컬의 본고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는 아이덴티티를 전달한 것이죠. 서울도 이야깃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도시라고 보는데, 하이서울은 뭘 말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아스럽습니다.

지역 브랜딩(슬로건)에 영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전문가 견해도 궁금합니다.
한국, 그리고 서울의 경우 국제도시고 세계 속의 한국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건 결국 외국인들의 관광, 자본 유치가 될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어로 쓰고 그에 맞는 영어를 병기하는데, 해외 컨퍼런스에 가보면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정도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지요.
꼭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역사를 알리려고 브랜딩 활동을 한다면, 한글을 쓰는 게 더 낫겠죠.
해외에선 지역의 브랜딩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나요?
인터널 인게이지먼트(Internal engagement. 내부 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예요. 내부적 공유를 기반으로 외부로 확산시켜 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앞서 소개한 런던은 ‘런던 언리미티드’의 내부 공유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관계자들에게는 브랜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있는 투어키트를 제작해 나눠줬고, 런던 시민들에게도 브랜드가 쓰인 우산을 나눠주며 알렸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부에서 충분히 팽창시킨 후 외부에 발표했죠.
지자체 진단을 위한 활동 중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하는데,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는 대규모 리서치를 통해 브랜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에든버러를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나갈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영국, 아일랜드와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대적인 리서치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알아낸 사실은 관광객들은 영국, 아일랜드와 큰 차이를 못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힌트도 얻었는데, 사람들이 오래된 성, 시인 월트 스콧(Walter Scott) 기념탑 그리고 멜깁슨(Mel Gibson)이 기억에 남는다고 꼽은 것이죠. 멜깁슨은 영화 <브레이브하트(Braveheart)>의 월레스 역 때문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니 에든버러는 문학, 문화적 요소가 강한 곳이라는 점을 부각해 영감을 불어넣는 도시란 뜻의 ‘인스파이어링 캐피털(Inspiring capital)’을 도출했습니다. 인스파이어링은 흔히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든버러는 문화, 문학, 축제 등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브랜딩해 그 가치를 높인거죠. 이런 리서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브랜딩 전략과 지자체의 브랜딩 전략,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아이덴티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려 요소는 달라집니다. 당연히 기업 쪽은 경제적 가치를 가장 우위에 둡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피면 지역은 독창성, 역사를 살펴야 하고요. 반면 기업은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고객의 현재 니즈가 아닌 앞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것을 담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 리서치를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리서치는 현재 니즈는 드러내지만 앞으로 무엇을 원할지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기업들은 지금이 아닌 10년 후를 바라보는 아이덴티티를 브랜드에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서드플레이스(3rd place)’를 강조하는데 당시 고객의 니즈는 ‘맛있는 커피’면 충족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타벅스 매장은 3~4시간씩 머물며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편한 공간이 된 것이죠. 기업의 브랜딩은 가치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