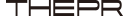[더피알=강미혜 기자]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 이후 ‘인공지능’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뜨거운 키워드가 됐다. 수개월째 각종 방송과 강연, 저서 등을 통해 관련 콘텐츠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주가도 전에 없이 치솟았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교수가 ‘쥐고 있던’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공지능을 설파하고 다니는 국내외 저명학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의 ‘일천한 지식’을 꼬집었다.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로 포장되는 세태를 향한 날선 비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페이스북은 삽시간에 달아올랐다. 이견을 제기한 이도 있지만 상당수가 격하게 동감의 뜻을 표했다. 누군가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보다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더 추앙받는 사회”라며 “적당히 배운 가닥으로 인공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걸 보면 참 허탈하다”고도 말했다.

이 논쟁을 지켜보며 너무도 익숙한 기시감이 들었다. 많은 홍보인들이 비슷한 분통을 터뜨려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홍보전문가라는 이름은 엉뚱한 데서 싸잡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홍보위원장’ 타이틀과 함께 국회에 입성했다가 최근 리베이트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선 정치신인. 덕분에 요즘처럼 홍보, 홍보업체, 홍보전문가란 용어가 언론상에서 핫하게 오르내린 적이 또 없다. (*학계 및 업계에선 홍보(弘報)→PR(Public Relations), 홍보전문가→PR전문가로 명명하고 있으나 편의상 홍보로 표현)
한 PR컨설팅 회사 대표는 일련의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로고=홍보. 로고제작사=홍보대행사. 로고 만드는 사람=홍보전문가. 로고 만드는 비용=홍보비. 로고 만든 후 리베이트=홍보비 리베이트.
대학교 학과나 부서 이름들도 좀 바뀌어야 할 듯. 언론홍보과=언론로고과. 홍보기획부=로고기획부. 홍보학 전공교수=로고학 전공교수. 홍보학 석사=로고학 석사. 홍보팀= 로고팀. 홍보이사=로고이사.
PR을 업(業)으로 삼는 많은 홍보인들이 해당 글을 보며 ‘웃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라 화도 나지 않는다는 허탈한 공감대가 깔려 있는 듯했다. 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홍보라는 단어를 막 갖다 붙여온 게 어제오늘 일이던가.
해외 언론에 열심히 ‘한국광고’를 내면 어느덧 ‘한국홍보 전문가’로 평가받고 ‘침대는 과학입니다’를 일깨운(?) 광고인이 당의 홍보위원장을 맡으면 홍보전문가로 돌변한다. 이제는 브랜드 네임을 만들고, 제품 패키지를 디자인한 사람까지 줄줄이 홍보전문가 소릴 듣는 상황까지 왔다.
오랜 실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PR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개탄했다. “PR하는 사람이 디자인 감각이 있다고 디자이너란 말을 하느냐, 카피 잘 뽑는다고 해서 카피라이터라고 하느냐”며 “그런데 광고나 마케팅, 브랜딩 쪽에서 있던 사람들은 ‘나 홍보한다’는 소릴 너무 쉽게들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어쩌다 홍보가 누구나 스페셜리스트로 둔갑하기 쉬운 장(場)이 돼버렸을까?
미국에서 정의하는 PR은 ‘조직과 공중 사이에 서로 유익한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Public Relations is a strategic communication process that builds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and their publics)’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익’과 ‘전략’이 결여된 ‘불구의 PR’이 유독 득세하는 실정이다. 보여주기식 홍보,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수사(修辭)를 잘 하는 기술자가 인정받는다.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총아라 하는 선거전에서조차 CI 리뉴얼이나 컬러 마케팅이 춤을 추는 판국이다. 큰 틀에서 진짜 홍보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판이 갖춰져 있지 않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홍보전문가들의 탓도 크다. 눈으로 보여주기 힘든 PR활동의 특수성을 핑계로 자기전문성을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사실을 앎에도 뒤에서 혀만 찼지 앞에서 돌직구를 던지지 않았다.
더욱이 학계와 업계에서조차 PR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일치된 정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무관심과 소극성, 현실외면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홍보전문가를 양산해냈다.
광고계 한 원로교수는 올 초 한국PR학회 20주년 기념 좌담에서 역대 PR학회장들을 향해 “PR이 PR을 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광고나 마케팅과 달리 PR의 기능이나 역할, 가치가 사회적으로 정확히 인식되지 못하는 데 대한 지적이었다.
그의 말마따나 PR전문가들이 PR의 정석과 진짜 전문성을 PR해야 한다. 스스로를, 본업을 제대로 PR하지도 못하면서 PR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할 때다.
“더피알은 PR해주는 매체 아닌가요”라고 묻는 모 언론사 데스크의 인식을 깨는 것. 해묵은 과제에서 더피알 기자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