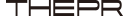| 브랜드텔링 1+1이란..? 같거나 다르거나, 깊거나 넓거나, 혹은 가볍거나 무겁거나. 하나의 브랜딩 화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과 해석. |
[더피알=원충렬] 요즘 가장 핫한 풍미라면 ‘병맛’이겠고, 그것에 굳이 등급을 매긴다면 B급이겠다. 지금 대체로 우리를 둘러싼 가장 왕성하게 소비되는 문화코드에 대한 이야기이다.
후각 예민한 마케터들이 병맛 레시피를 재생산하고 온갖 B급 소스들을 버무리고 있는 것은 이미 한참 전부터의 일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브랜딩과 마케팅에 있어서도 병맛과 B급이 확실히 대세다, 바이럴을 위해서 다른 소재는 제대로 먹히질 않는다고. 그리고 누군가는 예견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과연 그럴까?

B급은 계속돼! 하지만 브랜드는?
B급 문화는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다. 과거 우리는 ‘엽기코드’라는 B급 문화의 정수가 대중에 어떻게 소구되고 소비됐는지 이미 경험해본 바가 있다. 주류의 적극적 구애를 받는 시기가 있을 뿐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처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작금에는 (적어도 대중문화의 범주 안에서는) 가장 세련된 방식의 A급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들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 했던 브랜드들조차 점차 B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B급 문화에 모인 ‘꺼리’의 수와 양이 폭발적인데다가, 가벼움과 날것의 신선함이 주는 쿨함이 진동하기 때문이다. 그 확산력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
물론 브랜드는 유연해야 하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개비처럼 한 곳에 붙어 있다가 썰물에는 강렬한 태양빛에 말라 죽을 수도 있다. 차라리 해파리처럼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자유롭게 부유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형(形)과 색(色)을 시시각각 바꿔가는 해파리마저도 건드리면 탁 쏘는 한방이 있다. 자신의 영역과 가고자 함에 대한 주체성이 있다는 얘기다.
근래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넘어 공중파까지 점령한 메이저 브랜드들의 병맛 광고와 캠페인들을 보고 있자면, 때로 도구와 목적에 대한 혼동이 느껴지기도 한다.
잘 드는 칼을 쥐어보려는 건 알겠는데 저 브랜드에 어울리는 무장(武裝)은 아닌 것 같다는 절반쯤의 확신이 드는 경우가 늘어난다. 지엄하고 지긋하신 부장님이 느닷없이 SNL의 유행어로 주간회의를 시작할 때의 당혹스러움(웃어야 하나, 그럼 계속 할 거 같고, 아니면 서운해 할 것 같고)같은 것이 느껴진다.
병맛 소비하는 방식과 브랜딩
물론 갑자기 병맛코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 그 브랜드를 둘러 싼 내부 사정을 어찌 알까? 상상의 영역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브랜드의 지난 행보에 대한 기억은 있다. 그들이 구축해놓은 이미지나 잔상들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울리지 않음에도 그 브랜드들은 왜 갑자기 B급 문화의 비트에 몸을 기대는 것일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병맛은 사실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별 의미 없음은 병맛 고유의 특성이 아닌가) 그 형식이란 인과관계 부재, 의도된 저퀄리티(혹은 의도적으로 과잉된 고퀄리티), 어이없음으로 대충(!)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재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거 재미있으니까 너도 봐봐!’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 확산이 이뤄진다.
이때 확산의 시작점이자 콘텐츠 소비의 종착지이기도 한 각 고객들에게, 해당 병맛은 아주 빠르게 소비되고 일회적으로 휘발된다. 이러한 휘발성은 중요 포인트다.
앞서 말했듯 병맛과 B급의 본질은 형식, 즉 접근하는 태도와 표현하는 방식에 있는 것이지 담긴 내용의 의미는 덧없게 사라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케터나 브랜드 담당자는 양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증명해주는 각종 조회와 댓글 수치들에 스스로 만족하곤 한다. 실제로는 공갈빵에 불과한 경우가 많음에도.(실은 서로 다 알고는 있다)
B급 콘텐츠의 빠른 휘발성은 극복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다. 예전에는 언어화된 짧은 메시지 하나가 브랜드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발신자가 고객들에게 그렇게나 메시지를 각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시각화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로 확장된 후, 지금은 그 브랜드가 취하는 태도나 대할 때의 교감, 말할 때의 독특한 톤앤매너(tone&manners)에 대한 ‘경험의 영역’에서 형성된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꾸준히 일관되게 하면 그 병맛스럽게 말하는 형식 자체가 이 브랜드라는 화자의 고유 특성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키치(Kitsch)함으로 존재감을 이어가는 편강한의원이나, 재미(Fun)를 아이덴티티로 삼는 환타 같은 브랜드는 실제로 그렇게 그들다움을 획득했다.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다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는가.

다른 방법은 형식은 빌려오되 브랜드가 본래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포카리스웨트 광고캠페인인 <Jump>의 릴리즈 된 영상을 보면, 아침 조회시간에 느닷없이 퀸의 ‘We will rock you’를 열창하는 교장선생님이 나온다. 이러한 전후 없는 전개나 과도하고 작위적인 설정은 전형적인 병맛 콘텐츠의 서사 방식이다.
하지만 이내 청춘의 잠재력을 이야기하며, 수분 밸런스를 통해 신체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이온음료로서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고야 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병맛스럽게 느끼지는 않는다.
왜일까? 참된 병맛은 그 안에 고상한 이야기를 담으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도구로 취할 뿐,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보다 나은 선택임이 분명해 보인다.
병맛, 그래서 뭐?
병맛코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가장 쓸데없는 질문일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상관없잖아. 웃기면 됐지. 이게 바로 병맛의 쿨함이다.
그러나 브랜딩은 그래선 안 된다. 아무런 목적 없이 도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물론, 당장은 뜨고 눈에 드는 것부터가 급하다는 현실적 항변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병맛 광고들은 지금 브랜드들에 저마다 어떤 것을 남겼을까? 잠시만 강렬히 빛나는 원오브뎀(One of them)이 되고 싶은 건가? 그냥 한번 빵 터뜨리는 원히트원더(one hit wonder)가 되고 싶은 건가? 그렇게 뜨고 나면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건데?
언제나 그렇듯, B급 커뮤니케이션에도 로드맵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도의 출발점에는 여전한 하나의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원충렬
브랜드메이저, 네이버,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즈 등의 회사를 거치며 10년 넘게 브랜드에 대한 고민만 계속하고 있음.